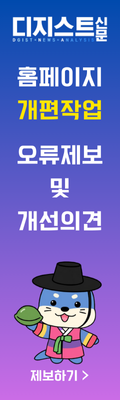지난 10월 6일, ▲메리 E. 브렁코(시스템생물학연구소) ▲프레드 램즈델(소노마 바이오테라퓨틱스) ▲사카구치 시몬(오사카 대학)이 면역관용(immune tolerance) 연구로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면역학의 오랜 수수께끼였던 면역관용의 분자적 기전을 규명하며, 면역 균형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면역의 핵심: ‘적’만 공격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면역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자기(self)’와 ‘비자기(non-self)’를 구분하는 일이다. 외부 병원체에는 강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자기 세포에는 공격을 멈춰야 한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계는 자신을 겨냥해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킨다.
이 과정의 중심에 있는 세포가 T세포(T cell)다. T세포는 외부 항원을 인식해 면역 반응을 이끄는 역할을 하며, 그 반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다른 면역 조절 신호들과 함께 균형을 맞춘다.
그러나 T세포는 무작위로 만들어져, 그중 일부는 자기 항원까지 공격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면역계는 자기 항원을 공격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하는 장치, 즉 면역관용을 진화시켰다. 면역관용은 면역계가 자기 항원에는 반응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 외부 방어를 유지하면서도 자기 조직을 보호하는 핵심 원리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20세기 중반 처음 과학적으로 정립되었다.
면역관용의 실마리, 쌍둥이 소에서 발견되다
1945년, 미국 면역학자 레이 오언은 쌍둥이 소가 태생기 동안 서로의 혈액을 공유하면, 성체가 된 뒤에도 상대의 혈액 세포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발달 단계에서 특정 항원에 노출되면 이후 그 항원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역관용의 최초 증거였다.
이후 1950년대 프랭크 버넷과 피터 메다워는 신생 생쥐 실험을 통해 이 현상을 재현하며 획득면역 관용(acquired immune tolerance) 개념을 확립했다. 면역계가 본질적으로 ‘공격만 하는’ 체계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공격과 관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동적 시스템임을 보여준 것이다. 두 연구자는 이 공로로 196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이 발견 이후 면역학의 관심은 “면역관용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기전으로 이루어지는가?”로 옮겨갔다.
중앙 관용: 면역계의 1차 안전장치
1960년대 연구자들은 면역세포가 성숙하는 흉선(thymus)에서 자가항원에 강하게 반응하는 T세포가 제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T세포는 생성 과정에서 무작위로 항원 수용체(TCR)를 조립해 매우 다양한 항원을 인식할 수 있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자가반응성 T세포도 함께 생긴다. 이러한 미숙한 T세포는 흉선에서 일련의 선택 과정을 거치고, 자기 항원을 강하게 인식하는 세포는 제거된다. 이처럼 흉선 내에서 자가반응성 T세포를 걸러내는 과정이 바로 중앙 관용(central tolerance)이다.
중앙 관용의 한계: 두 번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흉선이 우리 몸의 모든 자가항원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췌장에서만 만들어지는 인슐린이나 피부의 멜라닌 단백질처럼 조직 특이적 단백질들은 흉선 안에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양만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일부 T세포는 이러한 항원을 본 적이 없는 상태로 흉선을 통과해 말초 조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중앙 관용이 T세포를 완벽히 선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면역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는 중앙 관용 외에도 자가반응성 T세포를 억제하는 또 다른 조절 장치, 즉 말초 관용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구체적 작동 원리는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다.
이 난제를 풀어낸 것이 바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의 업적이다. 그들은 흉선 밖에서 면역 반응을 제어하는 조절 T세포(regulatory T cell, Treg)의 존재를 규명하고, 핵심 유전자 FOXP3를 밝혀내며 면역관용의 분자적 메커니즘을 완성했다.
말초 관용의 실체, 조절 T세포 발견

1990년대 중반, 일본 교토대학의 면역학자 사카구치 시몬은 말초 관용의 실체를 밝혔다. 그는 실험용 쥐의 비장과 림프절에서 CD4+ T세포 전체를 분리한 후, 그 집단 안에서 항상 CD25를 발현하는 소수의 CD4+ T세포(CD4+CD25+)에 주목했다.
사카구치는 CD25의 발현 유무 따라 두 집단이 면역 반응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였다. 그는 먼저 CD25를 발현하지 않는 CD4+ T세포만을 골라 면역결핍 쥐에게 이식했다. 그러자 해당 쥐는 심각한 자가면역성 위염과 갑상선염을 일으켰다. 반면 동일한 CD4+ T세포에 CD25를 발현하는 소집단(CD4+CD25+)을 함께 넣어 이식한 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 결과는 CD4+ T세포 안에 자가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별도의 소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CD25를 발현하는 하위 집단은 후에 ‘조절 T세포(Treg)’로 규명되며, 말초에서 자가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다.
FOXP3의 발견: 면역 억제 회로의 분자적 해답
사카구치의 연구가 면역의 브레이크 세포를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면, 2001년 메리 E. 브렁코와 프레드 램즈델은 그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핵심 유전자를 찾아냈다. 단서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돌연변이 생쥐, 스커피(scurfy) 마우스였다. 이 생쥐는 태어난 직후부터 전신 염증과 심각한 자가면역 반응을 보이며 곧 죽음에 이르렀다.
브렁코와 램즈델은 이 치명적 증상의 원인이 X 염색체에 위치한 FOXP3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임을 밝혀냈다. 정상 FOXP3를 도입하면 병이 사라졌고, 결함이 있으면 면역계가 즉시 폭주했다. FOXP3가 Treg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마스터 유전자임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발견은 곧 인간 질환으로 이어졌다. 소아 남아에게서 나타나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인 IPEX 증후군은 1980년대부터 보고됐지만 원인은 불명확했다. FOXP3 변이가 IPEX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생쥐 모델과 인간 질환, 그리고 Treg 기능이 하나의 유전적 축으로 연결되었다.
FOXP3는 이후 면역계의 자기 억제 회로를 지휘하는 핵심 유전자로 자리 잡으며, 면역학을 세포 수준에서 유전자 수준의 조절 메커니즘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면역학, 공격의 과학에서 균형의 과학으로
이후 FOXP3와 Treg는 많은 분야로 확장되었다. Treg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자가면역 질환을 억제하거나 장기 이식의 면역 거부 반응을 완화하려는 치료 전략이 개발되고 있다. 반대로 암에서는 Treg가 종양의 면역 회피를 돕기 때문에 이들의 기능을 억제해 항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도 활발하다.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3인의 발견은 면역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 면역은 더 이상 침입자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단순 방어 체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면역학의 중심은 ‘적을 어떻게 공격하는가?’에서 ‘몸을 어떻게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는가?’로 이동했으며, Treg와 FOXP3의 발견은 그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다.
박재윤 기자 dgist1001@dgist.ac.kr
'학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디지에 이런 랩실이?] 렌즈부터 계산까지, 우리는 생각하는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관찰합니다 : 이현기 박사의 ‘Camera Culture Group’ 연구실 (1) | 2025.12.29 |
|---|---|
| [디지에 이런 랩실이?] 숨겨진 수학 지식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 한강진 교수의 ’텐서들의 공간의 대수와 기하에 대한 연구 및 응용 연구실’ (0) | 2025.11.25 |
| [2025 노벨 물리학상] 슈뢰딩거가 놀랄 반전, 거시 세계에서도 양자 터널링 일어나 (0) | 2025.11.11 |
| 제27회 DLS: 2024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빅터 앰브로스 교수 초청 강연 (0) | 2025.02.17 |
| [2024 노벨 물리학상] 인공 신경망의 이론적 기반 발명, 그 배경의 학제적 연구 (0) | 2024.11.20 |